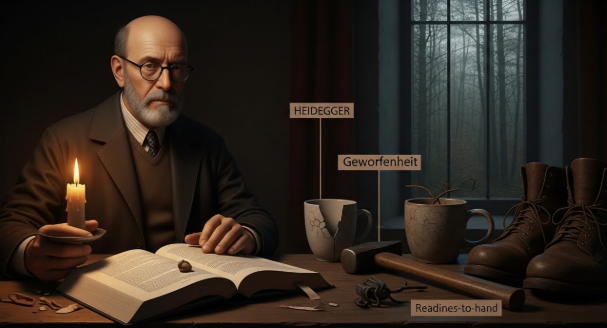
하이데거 철학에서 양심의 부름은 도덕적 판단이나 선악의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이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도덕적 목소리를 떠올리지만, 하이데거가 말한 양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그의 양심은 규칙을 알려주거나 행동을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자기 자신의 존재 앞에 세워 놓는 침묵의 부름에 가깝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인의 기준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구조에 익숙해진다. 하이데거는 이 자동적인 삶의 흐름을 깨우는 신호로서 양심의 부름을 해석했다. 이 글에서는 양심의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이 불안과 죽음의 사유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는지를 길고 깊이 있게 풀어본다.
양심은 왜 도덕처럼 느껴질까
일상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주로 도덕과 연결된다. 거짓말을 하려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양심에 찔린다고 표현한다. 이런 이해 속에서 양심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내면의 재판관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런 통념적인 양심 이해에 선을 그었다. 그가 보기에 이런 양심 개념은 이미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재를 깊이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는 양심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다시 끌어올리고자 했다.
하이데거가 묻고자 한 것은 이것이다. 인간은 언제, 어떤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자각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의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양심의 부름이다.
양심의 부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이데거가 말한 양심의 부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거나 “저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멈춰 세운다. 이 부름은 소음 가득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과도 같다.
이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정말 나의 선택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의 기준에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이데거는 이 질문이 바로 양심의 부름이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 부름이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완전히 주관적인 감정도 아니다. 양심의 부름은 인간 존재의 구조 안에서 스스로 울려 퍼지는 신호에 가깝다.
하이데거는 이 부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오는 호출’로 설명했다. 평소에는 세인의 말과 소문, 기대 속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이 부름을 통해 잠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부름은 불편하다. 듣기 싫고, 피하고 싶다. 이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바로 이 불편함이 인간을 본래적인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양심의 부름과 불안, 죽음의 연결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양심의 부름은 불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불안 속에서 세계의 의미망이 흔들릴 때, 인간은 자동적인 일상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때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양심의 부름이다.
또한 양심의 부름은 죽음의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양심의 부름은 이 사실을 말없이 상기시킨다. 지금 이 삶은 나의 것이며, 그 책임 역시 나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양심의 부름은 위로가 아니라 각성에 가깝다.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묻게 만든다. 하이데거는 이 물음이 인간을 진정한 선택의 자리로 데려간다고 보았다.
양심의 부름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말한 양심의 부름은 인간에게 정답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삶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다. 이제 선택은 나의 몫이며, 그 결과 역시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양심의 부름은 도망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바쁨과 역할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부름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기 어려워진다.
결국 양심의 부름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목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통로다. 이 부름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하이데거에게 양심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존재의 알람이다.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잠시 울리는 이 침묵의 신호는, 인간에게 묻는다. 지금 이 삶을 정말 나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존재론은 더 이상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붙잡는 사유가 된다.